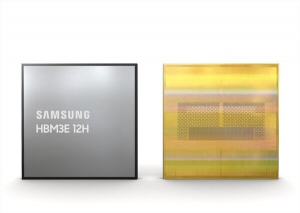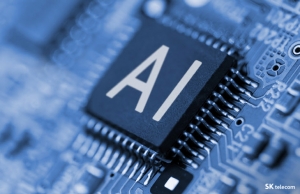|
|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사진제공=스타더스터) |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 얼마나 솔직하고 너그러운가. 그리고 내 사랑과 사람들에 얼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
책임감과 솔직함, 묘하게 어긋나는 키워드처럼 오해와 인내에도 관계를 유지해온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8월 20일까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2관 더블케이씨어터)은 그렇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을 수차례 던져댄다.
남자와 여자가 있다. 연옥(진경·윤유선, 이하 앞 관람 배우)은 종군기자로 평생 분쟁지역을 오가며 자신의 일과 행동에 대한 책무감과 중압감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남자(조한철·성기윤)는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사랑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데 급급했다.
 |
|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연옥 역의 진경(사진제공=스타더스터) |
두 남녀는 부부는 아니지만 연인처럼, 친구처럼, 남매처럼 반평생을 함께 했다. 서로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둘 사이에는 딸 이경(박정원)이 있지만 가족불화는 나 몰라라 국제분쟁지역을 떠도는 엄마와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아빠 덕(?)에 천둥벌거숭이처럼 살고 있다.
남자는 한번의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으며 이미 배우자가 있는 여자와의 열애로 결혼을 고민 중이고 여자는 위암 판정을 받고 은퇴를 결심했다.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하는 연옥을 밖으로 끌어낸 이 역시 정민이다.
은퇴했다는 연옥에 정민은 매주 목요일의 토론을 제안한다. 데이트를 빙자한 토론의 주제는 비겁함, 역사, 행복, 죽음 등 다양하기도 하다.
위암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은 연옥과 결혼을 고민하는 정민, 헌신적이지도 살갑지도 않은 엄마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생물학적 아빠에 방황하는 이경…자칫 무겁거나 진부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재개그와 철없는 생각들로 소소한 웃음을 선사하며 서로의 속내를 파고 든다.
작정하고 파고드는 심리묘사가 아니다. 누구보다 잘 안다 믿었던 두 사람은 매주 목요일의 토론을 통해 몰랐던 서로의 이야기와 진심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다소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대화들이 오가며 두 사람은 함께 했던 과거와 그제야 털어놓는 어긋났던 순간들 등을 떠올린다.
연옥은 진학을 위한 가출 감행, 극렬한 학생운동 가담, 이경의 출산, 극단적으로 위험한 지역에서의 취재활동 등 진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투철한 책임감으로 임했다. 책무에 치중했던 연옥은 스스로의 속내를 드러내거나 상처를 호소하는 데는 솔직하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
|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정민 역의 조한철(사진제공=스타더스터) |
정민은 감정에 지나치게 솔직하면서도 책임지는 데는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그렇게 책임감과 솔직함, 이 두 키워드에서 연옥과 정민은 극단적으로 다른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이다.
현재의 토론과 과거의 연옥(김소정)·정민(김수량) 이야기, 딸 이경의 사연이 자연스레 교차되며 자연스레 속내와 진심이 정체를 드러낸다. 연옥과 정민, 서로가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두 사람의 관계처럼.
연옥과 정민은 물론 그들의 딸 이경까지 고독에 찌들어 외로운 줄도 모르거나 천둥벌거숭이처럼 방황하는 이들의 과거와 현재가 장소를 바꿔가며 씨줄과 날줄처럼 엮인다. 그렇게 극이 진행되면서 지독히도 독립적인 것처럼 서 있던 이들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관계를 만들어간다.
 |
|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사진제공=스타더스터) |
이 모든 과정들은 ‘아이가 있지만 부부는 아닌 50대 남녀’라는 평범하지 않은 설정과는 달리 지극히 자연스럽다. 스스로를 가혹하게도 다그치고 속으로 삭이기만 하며 더 이상 다가들지 못하게 하던 연옥에 대한 원망,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결정적인 순간이면 거리를 유지했던 정민에 대한 질책과 회한, 순식간에 극의 공기는 달라진다. 급기야 터져 나오는 감정들은 ‘괜찮다’ 다독이고 오해하며 방치했던 시간만큼이나 깊고 안타깝다.
진경과 조한철, 베테랑 배우들은 지적이면서도 개구지고 강단 있으면서도 여린 연옥과 정민 그대로 무대를 지켰고 잔잔하던 극의 극적 전환도 순식간에 이뤄낸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다운 선택으로 연옥은 연옥으로서, 정민은 정민으로서 또 다시 일상을 살아간다.
기묘한 형태의 중년 남녀와 그들의 딸, 그 딸의 연인…그들이 엮어가는 관계와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얼마나 솔직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연관검색어
연관검색어






![['다'리뷰] 실화는 웃픈데 영화는 너무 웃겨!](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4y/01m/12d/2024011201000938300040681.jpg)
![['다'리뷰] 간만에 '깔깔'거리며 본 영화 '싱글 인 서울'](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3y/12m/03d/2023120301000127000004801.jpg)
![['다'리뷰] 영화 '아무도 모른다'에서 멈춰졌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괴물'로 돌아왔다!](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3y/11m/23d/20231123010016777000720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