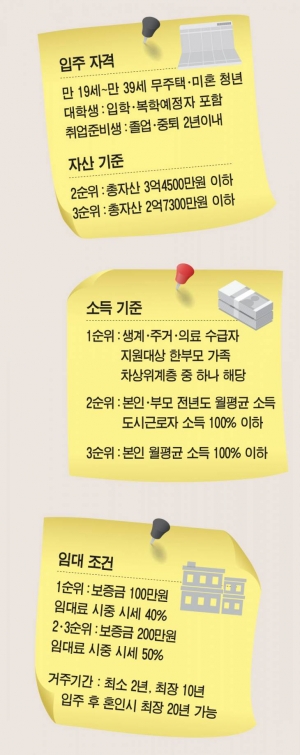|
| 영화 ‘군함도’.(사진제공=CJ엔터테인먼트) |
 |
| 허미선 문화부장 |
“군함도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 사실은 거기에 나쁜 일본인들만, 좋은 조선인들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국적 문제가 아닌 개인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저 쉽게 이분법으로 진영을 나눠 관객을 자극하는 건 오히려 왜곡하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죠.”
지난 19일 해방 직전과 직후 하지마 섬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영화 ‘군함도’ 언론시사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류승완 감독은 이렇게 강조했다.
그간 우리는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라는 명칭에 모든 악을 씌워 다뤄왔다. 일제의 전횡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댓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군함도’ 속 위안부 말년(이정현)의 말처럼 “돈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팔아넘긴 것도, 위안소의 포주도 조선인”이었다. 말년이 말한 그 ‘조선인’들은 여전히 이 사회에 뿌리를 깊이 박고 존재해 왔다.
“전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말 몇 마디로 한 사람을 거의 인간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언어로 행해지는 폭력이 당장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지만 사실은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
| 연극 ‘1945’.(사진제공=국립극단) |
연극 ‘1945’(30일까지 명동예술극장)의 배삼식 작가도 이렇게 토로했다. 일련번호, 프랑스놈들, 독일놈들, 조센징, 빨갱이…. 나치 파시즘의 대량학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제의 만행,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 세살박이 시리아 난민소년의 주검으로 불거진 이주민 갈등, 북한 억류 대학생의 죽음과 탈북자의 재입북 등은 같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상태로 부르거나 분류하면서 시작되고 심화됐다.
그 언어의 구사나 분류는 ‘정체성’ ‘소속’ ‘내 편과 네 편’ ‘진영’ ‘보수와 진보’ ‘흑백’ ‘선악’ ‘여혐’ ‘여야’ ‘불령선인과 친일파’ ‘전범’ ‘인종차별’ ‘나치와 유태인, 유태인과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장애인’ ‘편견과 선입견’ ‘갑을’ 등 다양하게 명칭을 바꿔가며 2017년 현재까지 대물림되고 있다.
부상자와 ‘영어 사용자’를 최우선 구조 집단으로 분리하는 장면이 수차례 반복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 역시 다르지 않다. 살기 위해 오른 배의 밑바닥, 총격으로 가라앉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누구든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내릴 사람은 정해져 있어. 저 놈은 프랑스인이잖아. 그 다음 내릴 사람도 정해져 있어. 우린 다 같은 사단 소속이야”라는 한 소년병의 말은 ‘군함도’, ‘1945’와 맥을 같이 한다.
 |
| 영화 ‘덩케르크’.(사진제공=워너브러더스코리아) |
‘박멸의 대상’이든 ‘싸잡아 한통속’으로 몰든 그 누구도 그 명칭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명칭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가며 진화하고 있다. 그렇게 진화하는 명칭들이 현실적이고 실제 폭력으로 전환되는 건 순식간이다.
다소 결이 다르게 풀어간 세 작품은 이분법적으로 진영을 나눠 모든 책임과 잘못을 덮어씌우기보다 개인의 구체적인 일상과 가치관을 집중조명한다. 절박한 생존 앞에선 누구든 인간적이기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기도 쉽지 않다.
끝없이 이유를 요구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공익을 위해, 우리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구분을 지으려 한다. 어딘가의 경계 안에 서면 덩달아 절대선이 되고 절대악으로 분류돼 한쪽으로만 비판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에서 내부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개입될 여지라곤 전혀 없다.
그렇게 척결 혹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최순실게이트, 유사이래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공공연한 비리, 권력자들 혹은 갑들 간의 담함 등 현재의 모순과 부조리로 대물림됐고 여전히 우리는 그 혼란 속에 있다. 류승완 감독이, 배삼식 작가가 “개인에 집중해 구체적으로 내부를 성찰하고 반성하고자 한” 이유다.
허미선 문화부장 hurlkie@viva100.com




 연관검색어
연관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