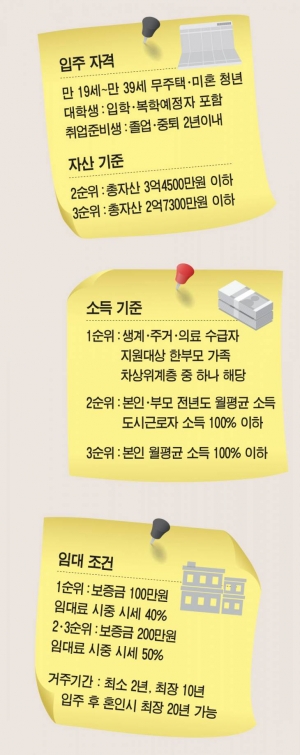|
| 이승제 금융증권부장 |
현대중공업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3두 마차’를 형성했고 이들 덕에 한국은 지난 십 수년 동안 글로벌 선박 수주의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오는 법이다. 늘 2~3년 어치 일감이 밀려 들었으니 매출 및 수익 향상은 따 논 당상이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선택은 노조에 ‘넉넉하게 퍼 준다’였다. 그래서 19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이 가능했다.
파업은 그렇다 치고, 왜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자동차 노조와 손을 잡았을까. 오랜 세월 데면데면하다 못해 으르렁대던 사이가 아닌가. 현대차·현대중공업 노조는 1990년대 범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동운동을 주도한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의 양대 근거지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2001년 해체됐다. 이후 현대중공업 노조는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며 ‘루비콘 강’을 건너 현대차 노조와 완전히 결별했다. 그런데 이제 과거를 거슬러 가고 있다. 무려 23년 만의 연대파업이다.
두 회사를 모두 출입해 본 경험이 있는 기자의 눈에 두 노조의 연대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선박 발주가 급감한 데다 중국 조선업체가 맹추격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현대중공업의 아성은 급격히 무너졌다. 적자의 늪에 빠졌으니 인심 좋게 노조에 퍼 줄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게다가 올해로 3년째 파업이라 하지만 무려 19년 동안 무파업을 하는 동안 ‘싸움의 감각과 기술’이 많이 무뎌졌을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입장에선 전투력의 ‘외부수혈’이 절실했을 법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현대차 국내공장의 생산직 평균연령은 47세였다. 정규 생산직의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한다. 두 요인이 맞물리며 2006년 당시 현대차 노무총괄담당 임원(그는 이후 현대차 사장까지 올랐다)의 예상이 적중하고 있다. “우리 회사 노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달라질 것이다. 평균연령과 연봉이 해마다 높아지니 자연 보수적으로 바뀔 것 아닌가.”
현대차의 국내 생산 비중은 10년 새 73%에서 36%로 반토막났다. 국내 사업장은 핵심 기지의 위치를 이미 잃어버렸다. 자연스레 사측이 느끼는 파업의 강도와 충격, 그리고 위기감이 작아지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현대차 사측은 수십 년 동안의 파업 속에서 컨틴전시 플랜 등 충격완화 장치를 다져왔고, 국내 공장이 아닌 해외에서 기회를 확대하는 ‘옵션’도 완비했다.
그러니 현대차 노조의 노련한 투쟁 전략가와 협상가(니고시에이터)들은 고민스러울 것이다. 자체 ‘전투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묘책이라고 내놓은 게 23년만의 연대파업이다.
이 같은 두 노조의 행보는 미래가 아닌 과거로 거슬러 갈 뿐이다. 뉴 노멀(New Normal) 시대는 투쟁의 질적 변화를 요구한다. 선진국 노조들이 유연성과 합리성을 지향하고 있는 이유다. 미래를 위한 질적 변화를 마다하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낡은 망령을 불러들인 두 노조…. 그들의 연대 뒤엔 사상 최고 수준의 위기감이, 화려했던 과거로 가고픈 헛된 관성이 놓여 있을 뿐이다.
이승제 금융증권부장 openey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