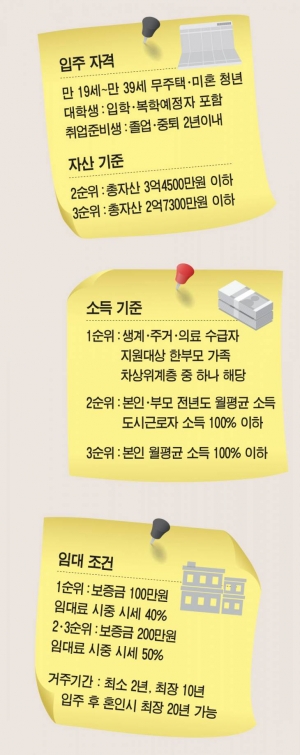|
|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
프랜차이즈 창업주들의 이력은 다양하기 짝이 없다. 대략 100조원 규모로 커진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업종별 1세대 가맹본부 창업주 상당수는 1990년대에 점포 하나로 시작해 지금의 중견기업을 일군 역전의 용사들이다. 그 중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교촌치킨이다.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68)은 1991년 경북 구미에서 33㎡(10평)짜리 ‘교촌통닭’을 열고 장사를 시작, 25년만에 본사 매출이 3000억원 가까운 중견기업을 일궈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아직도 그 시절의 애환을 잊지 못한다. 그 초심이 치킨 프랜차이즈 1등을 하게 된 배경이다. 가맹점을 열고 나서 2년간 하루 판매량은 두 마리를 넘지 못했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가장으로서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딛는 세월이었다고 그는 회고한다.
치킨집을 하게 된 사연도 드라마틱하다. 노점상, 건설노동자를 거쳐 개인택시 기사를 했다. 개인택시 면허를 판 돈으로 경북 구미시에서 치킨집을 차린 것이다. 점포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구미시 공단 지역 아파트단지 상가에 점포를 얻었다. 당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 가게였다.
가게 문을 열었지만 2년간 주문이 거의 없었다.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루 1∼2마리 사가는 게 고작이었다. 치킨 한 마리에 6000원 하던 시절이었다. 하루 1만원, 한달 30만원이 매출의 전부였다. 월세는 고사하고 한달 5만원 정도 나오는 전기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주문전화만 목이 빠지게 기다릴게 아니라 가게 이름이라도 홍보하자는 생각에서 114에 매일 문의전화를 돌렸다. “교촌통닭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판에 박힌 멘트를 매일 20통씩 날렸다. 전화 안내원들도 처음 들어보는 상호지만 문의전화가 매일 오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다.
마침내 전화안내원들이 치킨 두 마리 배달주문을 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이었다. 그는 주방에 들어가 정성껏 치킨을 만들었다. 행여 치킨이 식을까 봐 배달차량의 에어컨도 끄고, 치킨 두 마리를 갖다 주었다. 온몸이 땀에 젖었음은 물론이다. 따끈따끈한 통닭이 안내원들의 입맛을 돋구었다. 그날 퇴근 때 안내원 네 사람이 가게에 들러 한 마리씩 포장해갔다. 이날 점심, 저녁때 판 6마리가 2년간 최대 판매량이었다. 이런 애환과 간절함을 거쳐 지금의 교촌치킨이 탄생했다.
김용만 ‘김가네’ 회장(62)도 33㎡(10평)짜리 분식집으로 출발, 20여년간 김밥 프랜차이즈 시장을 장악해온 자수성가형 프랜차이즈 기업인이다. 김 회장은 1994년 ‘김가네김밥’ 간판을 서울 대학로에 내걸었다. 주력 메뉴는 즉석김밥이었다.
당시만 해도 김밥이란 미리 만들어놓았던 재고를 주문을 받은 뒤, 썰어서 주는 방식이었다. 김용만의 방식은 달랐다. 김밥 마는 과정을 손님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김밥 조리대를 창가에 설치했다. 손님들이 눈앞에서 식재료의 질감과 위생을 체감토록 했다.
식재료를 다양화하고 품질을 높여서 길거리 음식으로 치부되던 김밥을 훌륭한 한 끼 식사로 업그레이드했다. 김가네는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에 ‘김밥’이란 새로운 장을 개척한 공로가 크다는 게 학자들의 평가다.
언 땅에서 꽃을 피워낸 프랜차이즈 창업주들의 공로가 작년 7월 이후 깡그리 무시당하고,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자영업 출구전략 있나?](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2y/07m/13d/20220711010002586_1.jpeg)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자영업빙하기 닥쳐온다](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2y/07m/06d/20220705010000851_1.jpeg)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자영업대출 960조 ‘시한폭탄’](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2y/06m/29d/20220627010006292_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