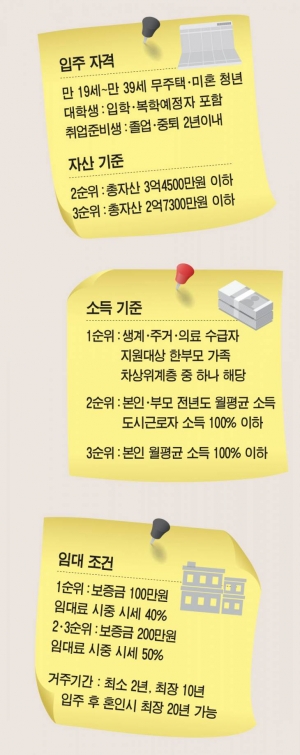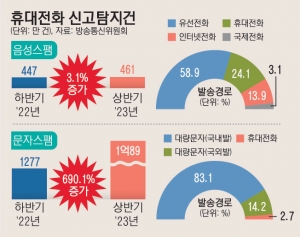아파트 이름이 복잡해진 시기를 특정하면 품질이 중시되면서 브랜드가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 주로 지역명을 붙이거나 건설사 이름만 붙이던 1979년 이전에는 평균 3자에 불과했다. 1980년대 3.5자, 1990년대 4.2자, 2000년대 6.1자, 2010년대 들어 8자로 길어졌다. 일시적으로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20자를 넘어 25자까지 늘어났다. 소재 지역에 건설사, 브랜드, 단지 성격이나 입지, 주변 여건, 교통편의를 반영한 펫네임이 조합되다 보니 긴 이름이 전형처럼 된 결과다.
재산 ‘포지션’에서 아파트가 중시되면서, 특히 과도한 자산 인플레이션이 긴 이름을 유도한 경향이 있다. 단지명이 아파트 가치를 상징한다는 등식을 믿기 때문이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오른 금액의 6배 가까이 오르면서 심화한 측면은 있다. 재건축 등으로 새로 이름을 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 한몫 가세했다. 고급 브랜드를 붙이는 이름 짓기 경쟁의 핵심은 집값 상승을 겨냥한 것이다.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품질이 중시되는 것과 맞물려 일반화된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주변 입지나 교통 호재를 반영해 좋은 이미지를 담는 것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이유는 없다. 소유자 동의를 거쳐 아파트 단지명을 변경하는 것 역시 문제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아파트 작명을 통해 차별화하고 건축물 이미지를 높이려는 시도를 욕심으로만 치부해선 안 되겠지만 이로 인해 피로도를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시어머니 못 찾게 작명했더니 시누이를 데려온다는 우스개가 통할 정도로 난해한 이름을 간결히 바꾸는 아파트가 일부 없지는 않다. 다른 법정동 이름을 사용한다면 자율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지역명 사용 제한 규정이 법적으로 있는지 여부가 쟁점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지역과 주변환경 등에 적합한 작명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 브랜드와 잘 연관된 경우 집값이 7.8% 올랐다는 사례도 있다. 아파트명이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한 이런 추세를 막기는 곤란하다. 서울시가 쉽고 간단한 이름을 짓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법적으로 민간 아파트 명칭을 규제할 근거는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고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국적의 외래어가 뒤범벅된 정체불명 아파트 단지명이라 할지라도 물론 건설사나 재건축조합 등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실상 간섭이 되거나 공공이 민간보다 효율적이라는 신념에 갇혀 규제 성격의 개입이 되면 안 된다.
재산 ‘포지션’에서 아파트가 중시되면서, 특히 과도한 자산 인플레이션이 긴 이름을 유도한 경향이 있다. 단지명이 아파트 가치를 상징한다는 등식을 믿기 때문이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오른 금액의 6배 가까이 오르면서 심화한 측면은 있다. 재건축 등으로 새로 이름을 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 한몫 가세했다. 고급 브랜드를 붙이는 이름 짓기 경쟁의 핵심은 집값 상승을 겨냥한 것이다.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품질이 중시되는 것과 맞물려 일반화된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주변 입지나 교통 호재를 반영해 좋은 이미지를 담는 것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이유는 없다. 소유자 동의를 거쳐 아파트 단지명을 변경하는 것 역시 문제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아파트 작명을 통해 차별화하고 건축물 이미지를 높이려는 시도를 욕심으로만 치부해선 안 되겠지만 이로 인해 피로도를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시어머니 못 찾게 작명했더니 시누이를 데려온다는 우스개가 통할 정도로 난해한 이름을 간결히 바꾸는 아파트가 일부 없지는 않다. 다른 법정동 이름을 사용한다면 자율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지역명 사용 제한 규정이 법적으로 있는지 여부가 쟁점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지역과 주변환경 등에 적합한 작명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 브랜드와 잘 연관된 경우 집값이 7.8% 올랐다는 사례도 있다. 아파트명이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한 이런 추세를 막기는 곤란하다. 서울시가 쉽고 간단한 이름을 짓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법적으로 민간 아파트 명칭을 규제할 근거는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고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국적의 외래어가 뒤범벅된 정체불명 아파트 단지명이라 할지라도 물론 건설사나 재건축조합 등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실상 간섭이 되거나 공공이 민간보다 효율적이라는 신념에 갇혀 규제 성격의 개입이 되면 안 된다.
관련기사
온라인 핫클릭
스포츠 월드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이시각 주요뉴스
- 한미사이언스, 노용갑 부회장 영입…“미래 성장 동력 창출”
- IAEA “이란 핵시설에 피해 없어…상황 면밀주시”<로이터>
- 대통령실, 비선 인사 개입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당근·배 추가해 25개로 확대”
- 태영건설, 회장포함 임원 감축으로 경영 정상화 나선다
- 이재명 “전세사기·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매듭질 것”
- 윤재옥 “빠른 당 수습과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국민 평가 받드는 것”
- 금융권 "채무 상환 부담으로 2분기 가계·기업 신용 위험 확대 우려"
- 계속 오르는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강남은 '주춤'
- 한국노총, “윤 정부 최저임금 차별 적용 막아야”
TODAY TO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