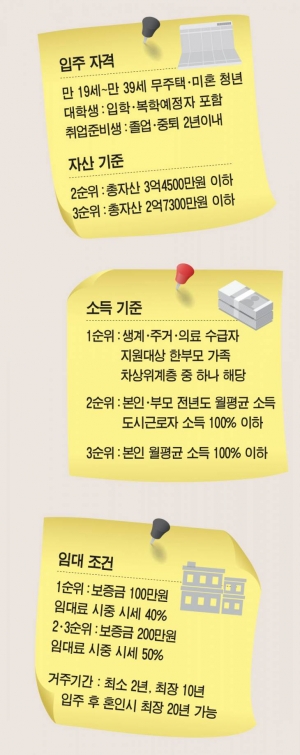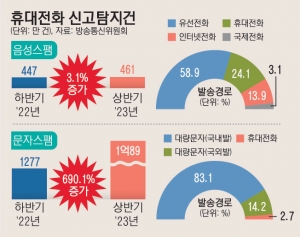|
| 지난 달 호이브로 공원에서 열렸던 ‘코펜하겐 2021’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코펜하겐 2021. Darren Gambrall 촬영 |
8월 21일 토요일 코펜하겐 시내가 오랜 만에 들썩였다. 곳곳에 무지개 색 깃발이 나부꼈다. 아이와 노인, 여성과 남성 혹은 그 밖에 성적 주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흥에 취해 거리로 나섰다. 코펜하겐이 세계 최초로 동시 유치한 세계 최대 성소수자 축제 ‘월드 프라이드’와 성소수자 스포츠 이벤트 ‘유로 게임’이 함께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올해 두 행사는 ‘코펜하겐 2021’이라는 이름 아래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과 인접한 스웨덴 3대 도시 말뫼에서 열렸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에서 1100여 개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리고 수 만 명이 참여했다. 21일 오후에는 코펜하겐 2021 폐막식에 앞서 시내에서 프라이드 행진이 진행됐다.
행진은 프라이드 행사의 하이라이트이지만, 코로나19 탓에 대폭 간소화됐다. 사전에 신청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거대한 행렬 대신 6곳에서 1000명 씩 시간차로 출발했으나 끝내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행진에 동참했다. 덴마크 국내외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도 대열에 합류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함께 걸었다. 프라이드 행렬은 모두 코펜하겐 동부 시민공원(Fælledparken)으로 모였다. ‘당신도 일원이다’(You are included)라는 슬로건을 전 세계 500만 명과 공유한 코펜하겐 2021은 왕실을 대표해 공식 후원자로 나선 마리 왕세자비의 환영사와 함께 막을 내렸다.
 |
| ‘코펜하겐 2021’에 참석한 마리 왕세자비(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정부 각료들. 왼쪽부터 라르스 바이스(Lars Weiss) 코펜하겐 시장. 코펜하겐 프라이드 대표 라르스 헨릭센(Lars Henriksen),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 마리 왕세자비, 아네 외르겐센(Ane Halsboe-Jørgensen) 문화부 장관 겸 교회청장. 덴마크 왕실(Det danske kongehus) 제공. Lars H. Laursen 촬영. |
공교롭게도 북유럽에서 세계 최대 성소수자 축제가 성황리에 끝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8월 25일 수요일. 서울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서울시가 2년 만에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2000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열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추구해 온 시민 단체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며 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면 사회 갈등을 야기해 공익을 저해한다는 서울시 주장이 사실일까. 간단히 검색만 해 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올 8월 23일 발표한 ‘2021년 안전한 도시 지수’(SCI 2021)에서 세계 주요 도시 중 코펜하겐이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평가했다. 코펜하겐은 5개 분야 중 개인 안전(personal security) 분야에서 단연 앞선 1등으로 나타났다.
라르스 바이스(Lars Weiss) 코펜하겐 시장은 EIU와 질의응답에서 “아동이나 노인, 남성이나 여성, LGBTI+ 혹은 다른 소수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코펜하겐에서 안전함을 느껴야 마땅하다”며 코펜하겐이 높은 사회 통합도와 비교적 작은 소득 격차 덕분에 높은 수준의 신뢰와 안전성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수에서 서울은 60개 도시 중 25위에 그쳤다.
바스크연구소(Basque institutions)가 2019년 11월 발표한 ‘도시 통합 번영 지수’(PICSA)에서 코펜하겐은 세계 3위로 꼽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물론이고, 개인의 안전과 교육 접근성, 인터넷 접근성을 일컫는 사회 통합 부문에서도 코펜하겐은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같은 지수에서 서울은 112개 도시 중 49위였다. 이런 사례는 지면이 넘칠 정도로 인용할 수 있다. 도리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성평등으로 나아간 도시 혹은 국가가 사회·경제적으로 번영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려도 충분할 정도다.
민간 성평등 연구기관 평등조치2030(EM2030)은 ‘2019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성평등 지수 보고서’에서 세계 129개국 가운데 덴마크가 가장 성평등에 가까운 나라라고 꼽았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성평등 지수는 보통 1인당 GDP와 비례하는데 한국은 러시아, 이라크 등과 더불어 유독 소득 수준에 비해 성평등 지수가 떨어졌다. 한국은 41위로 우루과이나 칠레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 ‘코펜하겐 2021’ 프라이드 행사에서 시민들이 행진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코펜하겐 2021. Darren Gambrall 촬영. |
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역시 EIU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9위로 9년 연속 꼴찌였다. 여성이 일하기 가장 불리하며 직장 내 여성 차별이 가장 만연한 나라라는 뜻이다. 반대로 여성이 일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는 북유럽 국가가 줄줄이 꼽혔다. 1위는 스웨덴, 2위는 아이슬란드, 3위 핀란드, 4위 노르웨이, 6위 덴마크였다. 5위는 프랑스에 돌아갔다.
한국은 왜 선진국 중에 유독 성평등 의식이 미비할까. 에이미 아담칙 뉴욕 시립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9년 <BBC>에 기고한 글에서 제시한 틀을 빌려 보자. 그는 한 사회가 성소수자 친화 혹은 혐오 태도를 갖게 만드는 3가지 요소로 경제 발전, 민주주의, 종교를 꼽았다.
생존을 위협받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의 ‘전통적인’ 가치에 순응하기 쉽다. 반면 부유한 국가에 사는 국민은 선택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으로서 안전함에 눈을 돌린다. 생리와 안전 욕구를 채워야 소속감과 존중을 넘어 자아를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설명이다.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자타공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나 소득 격차가 크고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탓에 사회구성원은 여전히 안전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하다. 객관적인 소득 수준에 비해 성평등 지수가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가 성소수자를 포용하기 쉽다. 공산주의를 표방한 전체주의 국가는 성소수자에 적대적이다. 갓 민주화된 나라에서도 성소수자는 차별받기 십상이다.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아직 경험이 일천한 나라다. 1993년 문민정부에 들어서야 일본 제국주의를 답습한 군부 권위주의를 벗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할 기회를 되찾았다. 올해로 28년 밖에 안 됐다는 얘기다.
1527년 농민을 포함한 4개 계급을 대표하는 신분제 의회부터 시작해 1866년 현대적 양원제를 세운 스웨덴이나, 1848년 무혈 혁명으로 입헌군주국이 된 덴마크, 1919년 헌법을 만든 핀란드에 비하면 한국은 민주주의 새내기다.
마지막으로 신앙심이 두터운 나라는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경향이 크다.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등 동성 결혼 합법화의 최전선에 나섰던 유럽 국가는 사회가 세속화돼 종교의 영향력이 미비하다. 덴마크는 여전히 헌법에 복음주의 루터교를 국교로 명시하고, 정부 기관으로서 교회청이 남아있음에도 관혼상제 같은 문화적 영향력만 남아있을 뿐이다.
 |
| 코펜하겐 홀에서 펼쳐진 공연 모습. 사진 제공 = 코펜하겐 2021. Darren Gambrall 촬영 |
반면 이슬람이나 보수적 프로테스탄티즘이 대세인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곳이 많다. 아프리카 주민 60%와 아시아 주민 98%는 “종교가 항상 중요하다”고 여긴다. 두 지역 국가 중 절반은 동성간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한국리서치가 202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성인 중 24%가 종교 활동이 본인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다. 성인 중 46%가 종교를 믿으며 이 중 절반은 한 달에 1번 이상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 물론 모든 한국 종교인이 성소수자를 배척하지는 않겠지만, 보수적인 종교 단체가 반대 여론의 최전선에 서 있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낙담하기는 이르다. 에이미 아담칙 교수가 짚은 3가지 요소는 상수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며 늘 바뀌는 변수다. 한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데 10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권위주의를 벗어난 지 23년 만에 유혈 사태 없이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하는 유럽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종교를 믿는 인구는 2004년 54%에서 2021년 40%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 세대만 돌이켜 봐도 비정상으로 치부했을 만한 일이 이제는 인정받는다. 이제 지상파 방송국이 부친이나 다문화 가정, 비혼모의 육아 생활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 희망을 걸어볼 만한 이유다.
어쩌면 성평등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할 디딤돌일 지 모른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젠더연구센터(NIKK) 연구진은 성평등이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의 삶의 질까지 상당히 개선함을 확인했다. 성평등한 국가에 사는 남성은 불평등한 나라의 남성보다 행복할 확률이 2배 높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우울증과 가족 붕괴, 폭력에 노출 등 불행한 일을 겪을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OECD는 성평등에 따른 여성 취업률 제고가 지난 50년 간 북유럽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현재 1인당 GDP 중 5000~6000달러는 여성 취업률 증가에 힘 입은 성과라는 얘기다. UN ‘세계행복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행복도를 끌어내리는 주범이 개인이 주체적으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종합해 보자면, 한국이 성평등한 사회로 거듭나면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의 질까지 고취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닿는다.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성평등 운동에 ‘한국 남성’인 나와 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사자인, 마땅히 당사자여야 하는 이유다.
안상욱 객원기자 andersen@nakeddenm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