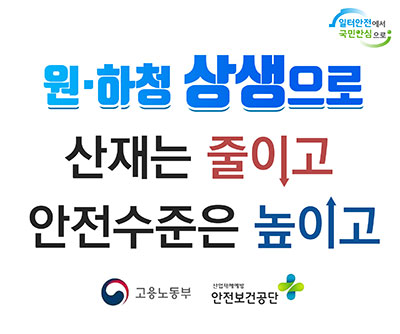|
| 문화평론가 한상덕 |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옆 마을 부잣집 둘째 부인의 딸이었는데 배우 임예진을 쏙 빼닮은 얼굴이었다. 아이는 때깔이 고왔고 입노릇도 부티가 났다. 소풍 갔을 때 우리가 찬물에 사카린을 타마시면 사이다를 마셨고 점심때 장아찌를 먹을 땐 계란부침을 먹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녀를 다시 만난 건 10년 전 동창회 체육대회에서였고 그날 이후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목 주름이 자글자글 하고 눈동자가 탁해진 아이를 현실에서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던 거다. 연정은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요즘 대중문화의 큰 손은 신중년이라 불리는 50~70대다. TV시청률은 물론이고 관객 동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덕분에 70대 박근형과 60대 윤여정이 영화 ‘장수상회’ 주연을 맡고 60대 중반 배우 김수미가 영화 ‘헬머니’에서 신나게 욕설을 퍼부을 수 있었을 게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중년은 이들이 출연한 작품이라고 무조건 소비하진 않는다. 왕년의 스타들이 보여주는 초라한 과거보다는 새로운 유행을 만나고 싶은 거다.
유행은 “인간의 뇌는 이용할 수 있는 선택사항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항아리 안이 채워지면 다른 항아리로 옮아가고 새 항아리는 이전 항아리의 결핍을 보완하는 속성이 있다.
꽃미남의 매끈한 모습이 지겨워지면 근육질 짐승남을 찾게 되고 짐승남의 머리 아래는 마음에 드는데 머리 위가 문제라면 차도남을 구하게 된다. 지적이면서도 근육이 적당히 있는 차도남이 싫증나면 뇌섹남으로 갈아타고 이도 싫으면 곧바로 새로운 남성상을 찾는다.
하지만 최근 문화상품들은 도대체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다. 신중년을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거나 문화적 능력을 무시한 처사인지도 모르겠다. 기껏 왕년의 스타들을 앞세우거나 신중년이 오래전에 소비했던 문화상품들을 리메이크하기에 급급한 인상이다.
반면에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는 뭔가 달라 보인다. 신중년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오랜 기간 드라마 소비의 최강자로 군림해온 20대 성향이다. ‘갑과 을’이라는 청춘의 핫이슈를 주제로 삼았고 스피드시대에 맞춰 극중 갈등을 한 회 안에 마무리했다. 피로감을 덜기 위해 선악 구조라는 고전적 틀도 과감하게 깨버렸다.
노소(老少)의 역할분담도 주요 시청 포인트다. 미성년자 서봄(고아성)은 슈퍼우먼이 되어 시부모의 허세를 충족시키고 자신을 깔보는 이들을 하나씩 굴복시킨다. 촉망받는 변호사를 언니에게 소개해주라며 여비서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가짜 그림을 팔러 온 시어머니 친구까지 물 먹인다. 위선 덩어리인 중년의 시아버지는 실패한 첫사랑을 향해 세속적인 연애를 갈구하지만 헛물만 들이킨다.
문화상품은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 아무리 소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정보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도 과거의 것들만으로 유행을 삼아선 안 된다.
그래야만 한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래야 한류를 배경으로 급성장한 화장품과 같은 공산품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신중년은 과거에만 기대는 세대가 아니다. 무대에 앙코르가 있듯 인생에도 앙코르 단계가 있어 새로운 일과 학습과 성장이 있을 것으로 믿는 세대다. 아이돌 그룹 각각의 이름이나 얼굴을 외우지 못하고 ‘썸남썸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유행을 아는 세대다. 신중년만 어울려 사는 마을을 싫어하듯 신중년만을 겨냥한 문화상품은 원하지 않는다. 신중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문화상품들이다.
문화평론가 한상덕
*외부기고의 일부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관검색어
연관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