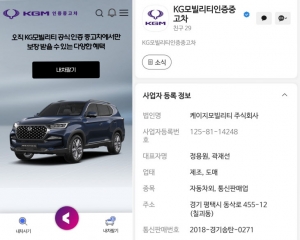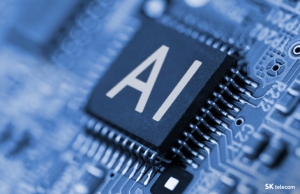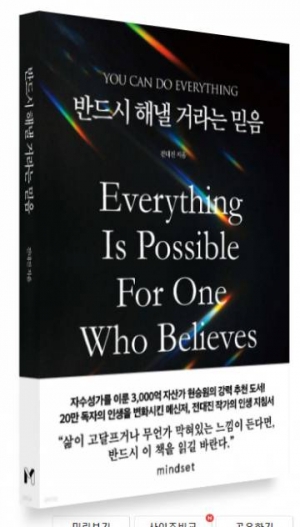![[국립극단]THE POWER_공연사진02](http://www.viva100.com/mnt/images/file/2016y/11m/07d/2016110701000471000020671.jpg) |
| 연극 ‘더 파워’.(사진제공=국립극단) |
이 세상 지식 중 진리는 있을까? 지식은 인간의 경험치에서 기인하는 통계에 불과하다. 이 명제 역시 경험치에 의한 것이니 반드시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진실 혹은 거짓, 옮고 그름은 길들여진 자의식 속에 자리잡은 잣대에 의한 구분이다. 그러니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 역시 인간의 문제인 셈이다.
여기 그간 경험하지 못한 형식의 연극이 있다. 제목은 ‘더 파워’(11월 13일까지 명동예술극장), 독일작가 니스-몸 스토크만(Nis-Momme Stockmann)의 작품을 연출가 알렉시스 부흐(Alexis Bug)가 정승길, 김승환, 이기돈, 이철희, 정현철 등 한국 배우들과 만들어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괴팍하고도 불친절한 연극이다. 물론 이 또한 경험치 부족에서 오는 평가다.
![[국립극단]THE POWER_공연사진04](http://www.viva100.com/mnt/images/file/2016y/11m/07d/2016110701000471000020673.jpg) |
| 연극 ‘더 파워’ 1부 요새.(사진제공=국립극단) |
작품의 화자인 ‘작가’(정승길)는 배우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오롯이 대본에 의한 것이며 연극에서 작가는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강조한다. 그리곤 시시때때로 무대로 나서 배우들과 연극에 대해 논하고 관객에게 여러 가지 설명과 질문을 던진다.
일자리를 잃을까 전쟁의 종료를 두려워하는 초록군인들, 위계질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군대답지 않게 위아래는 수시로 바뀐다. 느닷없이 나타난 새빨간 용은 지나치게 깜찍해(?) 헛웃음을 자아낸다.
‘위’ 사람들의 비아냥, 아래 사람들의 비굴함, 말이라고는 통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벽들. 어딘가 낯설지 않은, 현재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무실 풍경이 난무한다.
![[국립극단]THE POWER_공연사진07](http://www.viva100.com/mnt/images/file/2016y/11m/07d/2016110701000471000020674.jpg) |
| 연극 ‘더 파워’ 2부 타워.(사진제공=국립극단) |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쳐버린 틀은 지독히도 견고하다. 성과만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권력에 핍박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편안하다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 뭔가 불안하고 쫓기는 기분은 그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
프롤로그와 1부 요새, 2부 타워, 3부 구름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된 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 하나하나, 권력이 막무가내로 사람을 뭉개버리는 행태는 꼭 지금의 우리를 닮았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자본주의는 그렇게 적나라한 계급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명백한 수직구조로, 그리고 수평구조지만 타인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 의해 견고해진 상하구조로 진화했다.
![[국립극단]THE POWER_공연사진16](http://www.viva100.com/mnt/images/file/2016y/11m/07d/2016110701000471000020675.jpg) |
| 연극 ‘더 파워’.(사진제공=국립극단) |
자유로워 보이는 노숙자(이철희)는 어딜 가나 누굴 만나나 위축되고 눈치 보느라 불안한 나(이기돈)에게 “내 모습이 너의 미래일까봐 무섭지?”라고 묻고는 조언한다. “하지만 내 모습이 돼야 진정 행복할거야.”
철저한 계급구조 아래서, 보이진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상하관계 속에 꼭두각시였던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성과주의에 스스로를 속박하며 기꺼이 누군가의 조정에 부응한다. 급기야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 의해서도.
어쩌면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극은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럽게 무서운 현상을 희화한다. 어이가 없어 터지는 허탈한 웃음 뒤에는 “나는 어떤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국립극단]THE POWER_공연사진23](http://www.viva100.com/mnt/images/file/2016y/11m/07d/2016110701000471000020672.jpg) |
| 연극 ‘더 파워’.(사진제공=국립극단) |
작가의 “이 연극이 끝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맥락이라고는 없이 이런 저런 신들을 늘어놓는가 하면 관객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는 연극 ‘더 파워’는 낯설고 정신없는 소동극이다.
연극을 보면서도 버릇처럼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면 이 극은 그저 소동극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저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며 웃었다면 분명 남는 대사 하나, 상상력을 발휘할 만한 계기 하나쯤은 가지게 된다. ‘당근과 채찍의 다른 말은 탐욕과 낙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노숙자의 주장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대로 당근과 채찍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연극 ‘더 파워’는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 ‘전지전능하다’던 작가는 누구였는가? 온전히 나였는가?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연관검색어
연관검색어






![['다'리뷰] 실화는 웃픈데 영화는 너무 웃겨!](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4y/01m/12d/2024011201000938300040681.jpg)
![['다'리뷰] 간만에 '깔깔'거리며 본 영화 '싱글 인 서울'](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3y/12m/03d/2023120301000127000004801.jpg)
![['다'리뷰] 영화 '아무도 모른다'에서 멈춰졌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괴물'로 돌아왔다!](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3y/11m/23d/20231123010016777000720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