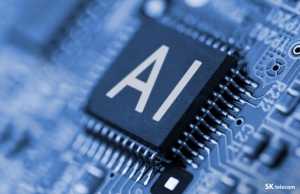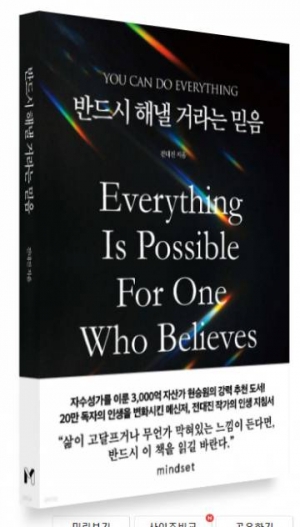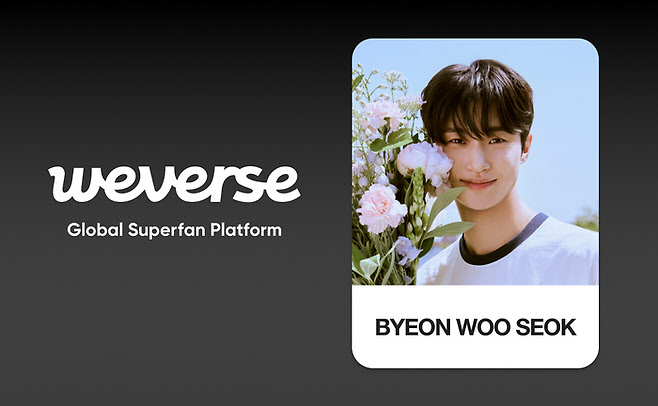일본의 수출규제 1년 반이 지났지만 소재·부품의 일본 의존은 여전했다. 지난해 소재·부품 수입액의 16.0%가 일본 제품이었다. 결은 조금 달라졌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점유율로 보면 오히려 2019년의 15.8%보다 소폭 상승했다. 대일 무역적자 개선이 중장기 과제임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이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이전부터 누적된 숙제였다. 수출규제 이후의 공급처 다변화에 대응해 반도체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이 충남 등 국내로 진출하기도 한다. 무역수지 적자 개선이 의지만 갖고는 개선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탈일본화가 이처럼 어려운 것은 기업과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기간이 짧아서만은 아니다. 지난 2년간의 실적을 보면 대일 무역적자 감소세로 개선 조짐이 보이는가 싶으면 이내 원래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된 수준이다. 10년은 걸릴 것이라던 1990년대 초반의 예측은 20년이 더 지나도록 적중하지 않았다. 소재부품특별법도 사실 일본의 수출규제 18년 전인 2001년에 이미 제정했다.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와 공장 설비로 수출을 늘려오면서 고착된 대일 무역적자는 구조적인 약점에 기인한다.
지난해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로 수입한 장비 수입 금액이 증가한 경우다. 수출규제 정국을 무색하게 한다. 석유화학, 철강 등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은 줄었다. 국내 불매운동으로 일본 승용차나 식료품 수입이 각각 37.2%, 20.7% 감소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무역수지 개선의 핵심은 한·일간 차이를 잘 파고드는 일본을 품질로 제압하는 것이다. 중급기술 개발로 고도의 기술력과 고부가가치의 격차를 줄이거나 추월할 수는 없다. 원자로, 기계류, 광학기기, 플라스틱 등 반도체 이외의 소부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출이 늘수록 대일적자가 늘어나는 딜레마 극복이 핵심이다.
대일 무역수지의 등락에 물론 일희일비할 것은 없다. 소재·부품·장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성질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후방(부품 및 완제품)산업만 보고 연구개발에 뛰어들 여건을 더 획기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지난해 사례는 수출이 느는 만큼 수입이 늘어 대일 무역적자가 커지는 현상이 바뀌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가마우지 경제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무역적자가 큰 부문은 생산기술 격차가 크다. 대일 소재부품 수입액 점유율이 0.2% 늘고 줄어드는 문제라기보다 한·일 간 고급기술 격차 고착화를 막아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