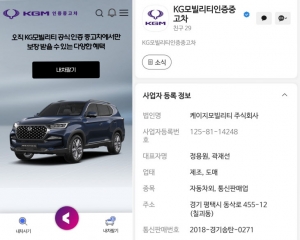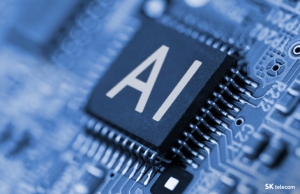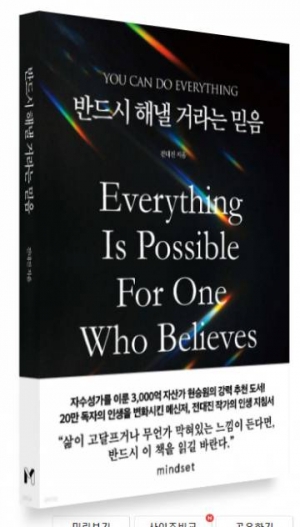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의정 갈등이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으로 빠져든다.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냈던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이탈한다. 효력이 발생하건 안 하건, 병원을 떠날 생각이 실제 있건 없건 더 나쁜 국면에 진입한 건 틀림없다. 대학병원들은 주 1회 수술·진료를 중단하는 ‘셧다운’에 속속 나서고 있다. 뜸을 들이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주요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로 열렸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이다. 빅5 병원에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게 되면 주요 대형 병원으로의 확산은 시간문제다. 과거 사례가 어떻든지 교수가 대거 병원을 이탈해 진료가 마비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낙관론은 애초에 접는 게 좋다. 의사 사직서를 대학본부에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본질은 효력의 다툼이 아니다. 의료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는 게 초미의 사안이다.
휴학 신청 및 수업·실습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방지와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에서도 의대 교수의 역할은 막중하다. 의대 증원의 당위성에 몇 번이고 공감하지만 정원 조정은 없다는 입장 고수엔 동의하기 힘들다. 대학별 정원 배정 이후 상수처럼 여겨지는 ‘2000명 증원’을 유연하게 푸는 것이 만능 키는 아니지만 남아 있는 좋은 변수가 없다는 현실론을 갈아엎은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원칙론만 갖고는 접점을 못 찾는다.
“5월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의료대란을 경험”할 거라는 엄포를 되돌릴 주체는 바로 의료계다. 의학교육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식의 절대불가침적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 길드(동업조합)적 연대라든지 카르텔적 구조가 지적되기도 한다. 그런 게 있다 한다면 그마저 지금은 대정부 압박 수위 높이기가 아닌 의료 붕괴 억제, 의정 갈등 해소에 써야 할 판이다. 의대 교수의 사직과 관련한 작금의 집단행동은 전공의 복귀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에 눈감고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겠다는 처신이 어찌 ‘환자를 위해서’일까. 언어도단이다. 교수 사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믿음의 근거는 또 뭔가.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결론이 될 수 없다. 의료개혁특위도 당장은 눈앞의 파국을 막는데 가장 먼저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를 트는 중재자 역할을 다해야 할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거듭 실망스럽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이다. 빅5 병원에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게 되면 주요 대형 병원으로의 확산은 시간문제다. 과거 사례가 어떻든지 교수가 대거 병원을 이탈해 진료가 마비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낙관론은 애초에 접는 게 좋다. 의사 사직서를 대학본부에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본질은 효력의 다툼이 아니다. 의료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는 게 초미의 사안이다.
휴학 신청 및 수업·실습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방지와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에서도 의대 교수의 역할은 막중하다. 의대 증원의 당위성에 몇 번이고 공감하지만 정원 조정은 없다는 입장 고수엔 동의하기 힘들다. 대학별 정원 배정 이후 상수처럼 여겨지는 ‘2000명 증원’을 유연하게 푸는 것이 만능 키는 아니지만 남아 있는 좋은 변수가 없다는 현실론을 갈아엎은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원칙론만 갖고는 접점을 못 찾는다.
“5월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의료대란을 경험”할 거라는 엄포를 되돌릴 주체는 바로 의료계다. 의학교육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식의 절대불가침적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 길드(동업조합)적 연대라든지 카르텔적 구조가 지적되기도 한다. 그런 게 있다 한다면 그마저 지금은 대정부 압박 수위 높이기가 아닌 의료 붕괴 억제, 의정 갈등 해소에 써야 할 판이다. 의대 교수의 사직과 관련한 작금의 집단행동은 전공의 복귀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에 눈감고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겠다는 처신이 어찌 ‘환자를 위해서’일까. 언어도단이다. 교수 사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믿음의 근거는 또 뭔가.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결론이 될 수 없다. 의료개혁특위도 당장은 눈앞의 파국을 막는데 가장 먼저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를 트는 중재자 역할을 다해야 할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거듭 실망스럽다.
관련기사
온라인 핫클릭
스포츠 월드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이시각 주요뉴스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다시 투표하면 찬성표 던질 것"
- 금리인하 기대감 하락에…채권형펀드에 자금 몰려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소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하마스 대표단, 오늘 카이로행…"휴전 협상에 긍정적"
- 뉴욕증시, 나스닥 1.99% 상승 마감…'골디락스'시장환경 왜?
- 상반기 IPO 최대 기대주 'HD현대마린솔루션', 8일 코스피 상장
- 월배당 ETF 인기…출시 2년만 순자산 7조 넘어
-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내달 퇴역…전국서 고별전시
- “전공의 일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어…전임의 계약률도 증가”
- 이재용·최태원도 참전…삼성·SK, HBM 주도권 경쟁 격화
TODAY TO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