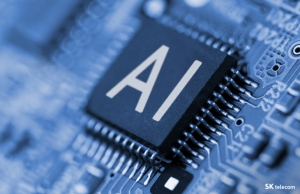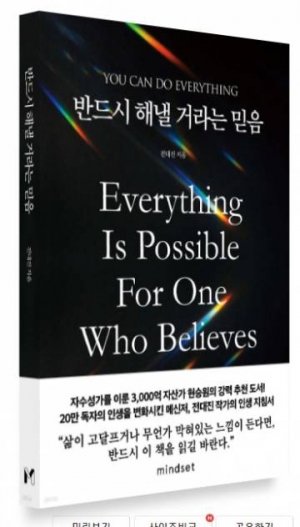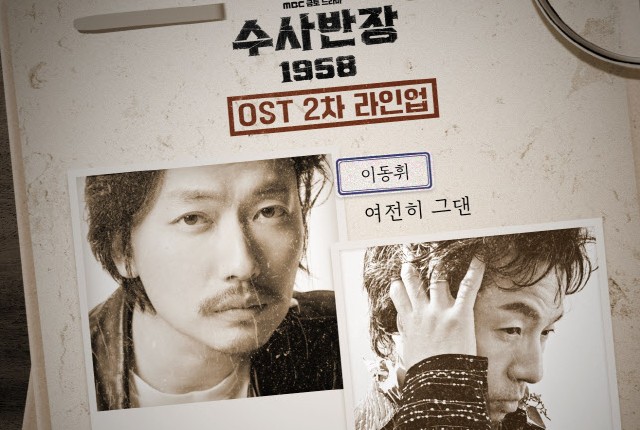코로나19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짓누르는 가운데 환경과 경제를 모두 잡는 정책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럴 때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경영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의뢰한 환경규제 기업 인식 조사에서는 82.7%가 경영에 악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기업에 강화된 환경규제는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그다음 경쟁력 약화가 기다리며 소비자 편익에도 전가된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등의 비용 부담이다. 물론 매출 600대 기업의 인식이 환경규제를 무력화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환경규제에 적응 기간조차 부여되지 않으니 기업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업들이 지적한 것이다. 환경규제 추세에 따랐다고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특히 대폭 강화됐다. 응답 기업들은 21대 국회에서 규제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와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일괄 규제보다는 기업 상황을 세세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적절한 환경규제다.
자동차 판매량의 15%를 친환경차로 맞춘 규정을 봐도 너무 일률적이다. 탄소배출 정책 강화가 추세이지만 가스·휘발유차가 저공해차 목록에서 몇 년 내 배제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과속이다.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과도한 쏠림은 막아야 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정책이나 혁신기술 지원도 시장 반응을 살피며 해달라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안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이다. 다른 예를 보면, 생활 속 거리두기 영향으로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0%나 늘었다. 소비자 기피와 정부 정책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한 결과다. 위생과 친환경은 때때로 대립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편향된 정책은 관련 산업을 위협하기 마련이다. 정책과 늘 같이 가지 않는 현실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대기 및 화학물질 규제, 자원순환 관련 규제 등은 하나같이 만만찮다. 기업 사정상 감당할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환경규제가 무역 장벽이 되는 점까지 감안하되 경쟁력 확보와 수익모델 창출에 매달리는 기업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린뉴딜 정책에서도 그렇다. 업계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바란다. 상당수 기업들은 코로나19가 불러올 최악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 최소한 환경규제에 대응할 시간이라도 줘야 합리적이다. 환경정책의 근간과 원칙을 허물라는 뜻이 아니다. 현실을 앞지르거나 빗나가는 규제를 문제시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등의 비용 부담이다. 물론 매출 600대 기업의 인식이 환경규제를 무력화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환경규제에 적응 기간조차 부여되지 않으니 기업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업들이 지적한 것이다. 환경규제 추세에 따랐다고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특히 대폭 강화됐다. 응답 기업들은 21대 국회에서 규제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와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일괄 규제보다는 기업 상황을 세세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적절한 환경규제다.
자동차 판매량의 15%를 친환경차로 맞춘 규정을 봐도 너무 일률적이다. 탄소배출 정책 강화가 추세이지만 가스·휘발유차가 저공해차 목록에서 몇 년 내 배제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과속이다.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과도한 쏠림은 막아야 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정책이나 혁신기술 지원도 시장 반응을 살피며 해달라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안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이다. 다른 예를 보면, 생활 속 거리두기 영향으로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0%나 늘었다. 소비자 기피와 정부 정책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한 결과다. 위생과 친환경은 때때로 대립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편향된 정책은 관련 산업을 위협하기 마련이다. 정책과 늘 같이 가지 않는 현실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대기 및 화학물질 규제, 자원순환 관련 규제 등은 하나같이 만만찮다. 기업 사정상 감당할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환경규제가 무역 장벽이 되는 점까지 감안하되 경쟁력 확보와 수익모델 창출에 매달리는 기업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린뉴딜 정책에서도 그렇다. 업계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바란다. 상당수 기업들은 코로나19가 불러올 최악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 최소한 환경규제에 대응할 시간이라도 줘야 합리적이다. 환경정책의 근간과 원칙을 허물라는 뜻이 아니다. 현실을 앞지르거나 빗나가는 규제를 문제시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온라인 핫클릭
스포츠 월드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이시각 주요뉴스
- 황우여 “전대 미루는 것 아냐…물리적으로 시간 더 걸릴 가능성”
- "수출 넘어 해외로"…중기부, 수출 100만불 중기 '3000곳' 육성
- 경총 "기업 84.6%, 22대 국회서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
- SKT, 1분기 영업이익 4985억원… "엔터프라이즈·AI 실적 견인"
- HD현대마린솔루션,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1% 상승
- ‘관광’·‘야구’…지역 특성 살린 특화 매장 뜬다
- 다재다능 '푸조 3008 GT'…패밀리 SUV로 딱! 코너링 실력은 '덤'
- [오늘의 1면] 기아·르노 야심작, 6월 부산서 동시 공개
- “수납에 취미 공간까지” 세대별 창고 갖춘 단지 ‘인기’
- 삼성전자, OLED 모니터 판매 1년만에 글로벌 1위 달성
TODAY TO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