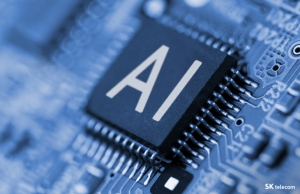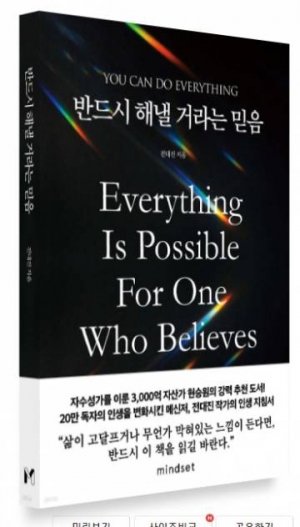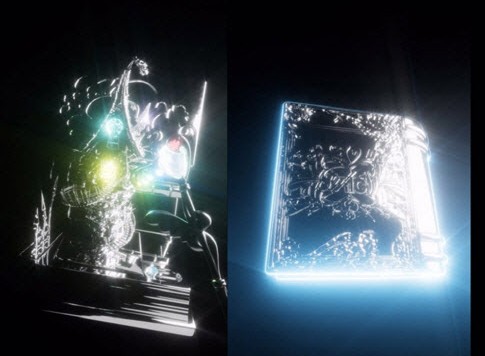|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령인구가 급증함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미루기 싸움’으로 인해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장치인 ‘노인보호구역’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율은 2만9146명(2010), 3만1563명(2012), 3만7167명(2014)으로 매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반면 2010년 12월부터 이미 가중 처벌을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2497건(2012), 1만1728건(2013), 1만2110건(201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 가중처벌제를 도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똑같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고, 주·정차,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2배 부과하는 것으로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단속 활동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전국의 노인보호구역에서 862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1만8000여개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비교해 노인보호구역은 20분의 1 수준으로 전국 670곳에 불과하다. 서울시만 봐도 지난해 10곳을 더 지정해 총 80곳으로, 1683곳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약 5% 수준이다.
이는 예산문제로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지자체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설치 예산의 5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 설치예산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예산배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국가보조가 안되다 보니 지자체 움직임이 느린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국가 보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노인보호구역의 범칙금을 다시 해당 구역을 보수·유지하는데 활용한다면 지자체 비용부담경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홍보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늘게되면 생활과 활동영역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스쿨존과 홍보가 덜 된 실버존을 함께 묶어서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며 이 구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과태료를 두 배 더 물게된다.
글·사진=노은희·김동현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