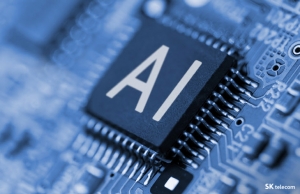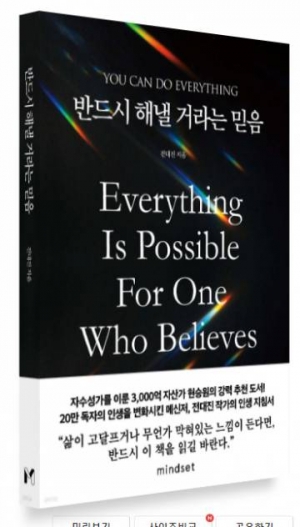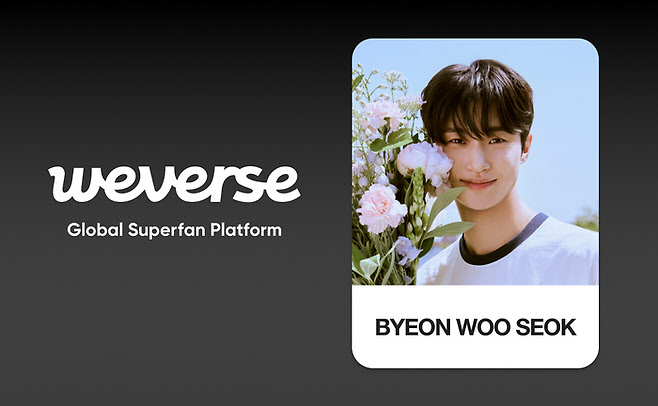|
|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다 못해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10조원 넘게 쌓여 있던 고용보험기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여기에 당장의 재정 파탄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 약 10조원을 더하면 6조원 흑자 상태가 된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다른 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실업급여제도의 자립적 운영이 불가해졌다는 점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데에는 무리한 실업급여 확대정책을 추진한 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9년 10월 문 정부는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해 실업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지급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실업자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는 2018년 107만 3000명에서 2020년 110만8000명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6조7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82% 급증했다. 실업급여 재정 위기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이다.
곳간이 비기 시작하자 문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했다. 기존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2019년 10월에 1.6%로 올렸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2022년 7월에 1.8%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증가율로 환산하면, 무려 38%에 달한다. 덧붙여 임기 중 고용보험료율을 두 번 올린 최초의 정부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다.
문제는 단순히 고용보험료율이 크게 올랐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가 근로자와 기업에 전가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게 된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제도로 인해 2년간 일자리가 약 11만개 감소하고 기업수는 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2년간 각각 1조8000억원(0.1%), 1조2000억원,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성원 전체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2년간 0.0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파급효과가 도출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린 확대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오른다. 증가된 고용보험료율 부담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전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 수가 줄어든다. 이는 일자리와 실질GDP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줄게 된다.
실업급여를 인상하면 겉으로는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그 여파가 결국 일자리와 실질GDP 감소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 부담이 더 늘기 전에 실업급여제도를 2019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