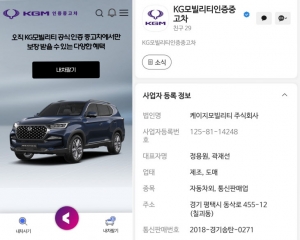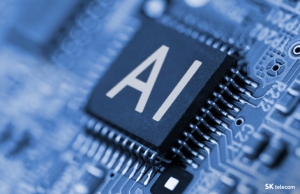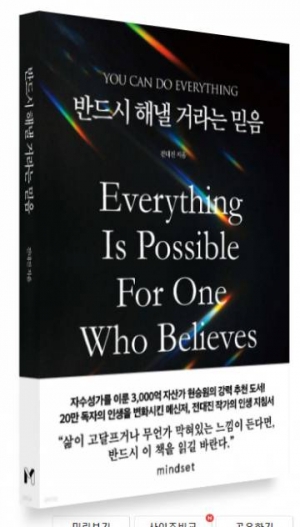|
| 한지운 산업IT부 부국장 |
“많이 찍으셨어요?” 호기심에 물었다. “몇 장 건졌어요. 휴대전화 바탕화면으로 쓰려고요. 돈과 명예를 다 가지신 분인데, 사진을 넣고 다니면 복이 올 것 같아서요.”
고(故) 이건희 회장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사에 공(功)과 과(過)가 교차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를 사랑했다.
좋은 제품을 만들며 빠르게 성장하던 국가였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는 ‘모방’이나 ‘이류’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는 미국과 일본 업체를 뛰어넘는 일류 제품을 전 세계에 선보이며 우리나라에 씌워진 오명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감히 우리가’라며 아무도 쉽게 마음먹지 못하던 일이었다. 삼성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는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이었고, 하나의 국격이었다. 포털과 SNS에서 고인을 그리워하는 추모의 글이 넘쳐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영웅의 퇴장이다.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투병에 들어간 만큼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런 상징성 때문에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도 컸다. 우리 경영계에 뛰어난 경영인은 많았지만, 국가의 위상까지 높인 경영인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남다른 ‘인사이트’가 있었다.
이건희 회장의 저서는 딱 한 권이다. 신문에 연재한 칼럼을 묶어 1997년에 출간한 ‘이건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가 바로 그것이다. 그가 회장 취임 이후 10년간 경영일선에서 겪은 체험과 당시의 경제 위기에 대한 처방을 담았다. 말이 에세이지, 사실상 경영서다.
20년 전 책이지만, 지금도 통할 법한 남다른 통찰력이 곳곳에 담겨 있다. “기업의 정보화는 재무나 생산이 아니라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라며 고객의 데이터 분석을 주문하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산업의 주도권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다. 제품과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제조업이 점차 매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계·전자·화학 같은 제조업보다는 정보·유통·문화 같은 서비스업이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말한다. 기업을 위해,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 결과가 좋았을 뿐이라고. 과연 그럴까.
“회사를 위해 일을 하지만, 타지에 있다 보니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수년 전 터키에서 만난 삼성전자 현지 법인의 임직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장의 경영철학은 임직원들의 일하는 자세에 스며든다. 짧은 시야로 단기적인 이익을 원한다면 직원들도 그렇게 일한다. 수장이 보국(報國)을 경영의 원칙으로 담는다면, 어찌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별세가 더 아쉽다.
그의 ‘공’으로 우리나라가 일류로 올라섰다면, 남은 ‘과’는 다음 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아버지의 유지도 그러했을 것이다. 대를 거친 마침표의 과정을 우리 사회가 지켜볼 만큼, 성숙해져 있는지 되물어본다.
한지운 산업IT부 부국장 gogum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