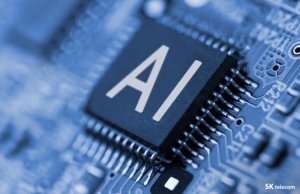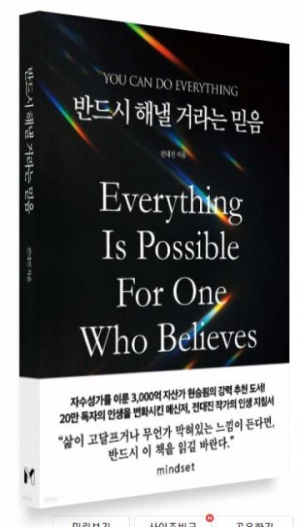|
|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사진으로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는 맨디 바커(사진=허미선 기자) |
“일종의 화법이랄까요. 영국 해변에는 분명 플라스틱이랑 쓰레기들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쁘고 다채롭고 화려하게 표현했죠. 그제야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가까이 가 보고서야 그것이 쓰레기, 버려진 플라스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겨 환경문제를 인식시키는 화법이죠.”
사진작가 맨디 바커(Mandy Barker)의 말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검은 바다 속에 버려진 축구공, 장난감, 노끈 등 쓰레기다. 혹은 그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토해내듯 내장에서 쏟아내고 죽어버린 붉은발슴새의 사체다. 지나치게 ‘예쁜 쓰레기’들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맨디 바커는 이를 “화법”이라고 표현했다.
“버려진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고 죽은 새들을 담은 ‘스틸(FFS)’(Still) 연작은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쇼킹하죠. 배를 갈라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는 너무 참혹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테니까요. 반면 아름다운 이미지에 감탄하며 관련 QR코드를 찍었을 때 참혹한 새의 현실, 환경오염 사태를 절감할 수 있죠. 그렇게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
|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사진으로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는 맨디 바커의 작품들(사진=허미선 기자) |
바다를 뒤덮은 존재들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표현한 그의 ‘홍콩탕:1826’(香港湯:1826), ‘얕은’(Shoal), ‘유통기한’(Shelf-life), ‘수프’(Soup), ‘에브리’(Every) 등과 환경오염으로 죽은 새를 담은 ‘스틸(FFS)’) 연작, 2014년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진행했던 ‘페널티’(Penalty) 시리즈 등은 중구문화재단이 새로 개관한 갤러리 신당의 첫 번째 사진전 ‘컨페션 투 디 어스’(Confession to the Earth, 9월 8일까지)에서 만날 수 있다.
“제 작품을 보고 플라스틱 장난감을 사면 새가 먹을 거라서 안산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영국에서는 아나바다 운동도 확산되고 있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옷, 도구, 장난감 등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바꿔 쓰고 나눠 쓰는 겁니다.”
◇모두가 사진작가인 시대, 그럼에도 사진의 힘!
 |
| 버려진 노끈으로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는 맨디 바커의 'SHELF-LIFE'(사진=허미선 기자) |
그가 강조한 “사진이라는 매체의 힘”은 스마트폰의 고도화로 모두가 작품에 버금가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 예술의 영역에 빠르게 스며드는 시대에도 유효하다.
“지금은 누구나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사진은 굉장히 즉흥적인 행위이고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진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스토리텔링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입니다.”
이어 맨디 바커는 “사진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육하고 메시지나 깨달음을 전달할 때 중요한 소통매체로서,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 또는 예술형태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한다”며 “제 전시를 본 분들이 감동받아 저마다의 생활 중 아주 작더라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사실 사진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사진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들을 알려주죠. 특히 제가 찍는 사진들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오지의 제한된 구역까지 들어가 작업한 것들이에요. 제가 본 것을 사진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미디어인 셈이죠.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이를 통해 기후 과학 분야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거나 기여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촘촘히 연결된 세계,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몫
 |
|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사진으로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는 맨디 바커(사진제공=중구문화재단) |
“한국의 바다 뿐 아니라 어디나 비슷해요. 플라스틱을 비롯한 썩지 않는 것들이 떠다니고 있고 이 때문에 죽거나 파괴되는 자연과 생태계가 있죠. 결국 제가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하는 환경 메시지는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세계, 우리 모두의 문제죠.”
그의 표현처럼 “핸데스 섬에 모여든 플라스틱의 국적은 25개.” 그렇게 그의 예술재료로 쓰인 쓰레기들은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것들이다. ‘페널티’ 시리즈 역시 “해변에 버려진 축구공을 보내달라”는 그의 SNS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4개월만에 89명이 41개국&섬, 144개 해변에서 보내온 769개의 쓰레기 축구공을 직접 그리고 배치해 표현한 작품이다.
 |
| 4개월만에 89명이 41개국&섬, 144개 해변에서 보내온 169개 쓰레기 축구공을 활용한 ‘페널티’.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강원도 속초를 방문했다 해변에서 주워온 축구공도 함께 전시돼 있다.(사진=허미선 기자) |
이 작품 앞에는 ‘컨페션 투 디 어스’ 개막 직전 방문한 한국의 강원도 속초 바닷가에서 그가 직접 주운 버려진 축구공이 전시돼 있기도 하다. 그렇게 오래 전 병속에 편지를 담아 띄우듯 한곳으로 모여든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지구는 역시 하나이며 서로 연결돼 있음을 목도하곤 한다. 그렇게 환경문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최근 환경보호를 외치며 에코백, 텀블러 등의 사용이 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많아져 오히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생겨나고 있다.
“사실 이 상황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개개인은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죄책감을 느끼며 보호를 위해 뭔가 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제조사입니다. 제조사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사지 않았을 거예요.”
 |
|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사진으로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는 맨디 바커의 작품들(사진=허미선 기자) |
더불어 경쟁하듯 ESG경영을 선포한 기업들의 ‘그린워싱’ 문제도 심화 중이다. 그는 “대부분의 회사가 ‘친환경’을 표방하며 관련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뭔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고 짚었다.
이어 “음식물들은 다 소분돼 플라스틱으로 포장돼 있다. 어떤 초콜릿은 작게 하나하나 알루미늄 포일이나 비닐로 싸여 있다”며 “하지만 바나나, 오렌지 등은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개인은 소분된 것들은 사지 않고 예쁘지만 독성물질이 쓰이는 핑크색 플라스틱 구매를 거부하는 것으로 소비자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아주 작은 행동과 실천으로 변화를 꾀하면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플라스틱 자체를 너무 많이 생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맨디 바커는 조언했다. 그는 “해양 플라스틱 수거 사업도 좋지만 영구적일 순 없다”고 덧붙였다.
 |
|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사진으로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는 맨디 바커(사진제공=중구문화재단) |
“제조사들이 플라스틱을 대량생산하지 않도록 혹은 소분하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거나 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령 마련과 더불어 이를 초기 기획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지자체 공간, 버려진 옷 프로젝트 그리고 예술
“(‘컨페션 투 디 어스’전이 열리고 있는) 이 갤러리는 지역 커뮤니티 베이스이기 때문에 로컬 분들에게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학생들은 물론 가족 단위, 노년층도 같이 혹은 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물이 아니라 개인 컵을 쓰게 하는 등 어려서부터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문화재단에서 개관한 갤러리 신당에 이같은 바람을 전한 맨디 바커는 “이후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을 방문 예정”이라며 “다음 프로젝트는 옷에 관련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60~70%가 합성섬유예요.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죠.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성향이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금방 싫증을 느낍니다. 어떤 옷은 한두번 입고 버려지기도 하죠. 그렇게 버려진 옷들을 영국의 한 해변가를 거닐면서 수거해왔어요. 그 옷들이 해조류처럼 보이게 연출하는 사진작업이죠.”
이어 맨디 바커는 “1800년대 한 예술가가 출판한 해조류 도감의 형식을 차용할 것”이라며 “언뜻 해조류처럼 보이지만 해조류가 아닌, 버려진 옷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사진으로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는 맨디 바커(사진=허미선 기자) |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1년 동안 옷이나 신발을 사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더불어 3가지 소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죠, 대부분의 옷들은 북반구에서 만들어져 버려지는데 그것들이 아프리카 가나나 칠레 아타카마 사막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곳에 헌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태그조차 떼지 않은 새 옷도 적지 않아요.”
향후 진행될 옷 프로젝트를 통해 “그런 옷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싶다”는 맨디 바커는 “예술과 사진, 환경은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 매개를 통해 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털어놓았다.
“제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과다 포장 등에 대해 깨닫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주변으로 확산시켜 주세요.”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연관검색어
연관검색어






![[비바100] 컬렉터에서 페어 창립자로, 저마다의 원앤온리를 찾아서! 아트 오앤오 노재명 대표 “오로지 예술”](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4y/03m/29d/2024032801002106700093317.jpg)
![[비바100]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민준호 대표 “친구들과 재밌는 일을 기다리는 창작 놀이터, 여전히 진화 중!”](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4y/02m/23d/20240222010014445000632511.jpg)
![[비바100]효성 커뮤니케이션실 최형식 상무 “함께 살아가는 세상만큼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4y/01m/25d/202401240100173090007535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