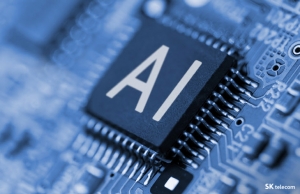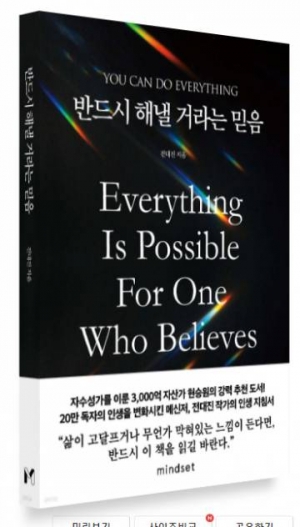|
|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역시 거의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난 20년간 독자적 경제 문화 정체성의 부재가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이 발끝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던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버블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장기 침체가 도래하면서 일본의 ‘국적기’인 일본항공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일본 전자업계의 대명사인 소니, 파나소닉이 삼성전자에 압도당하고 NEC, 히타치, 도시바 같은 대기업이 더 높은 수준의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그렇다면 20세기를 풍미한 일본의 경제는 왜 21세기 들어 맥을 못 추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섬나라 문화의 특징인 폐쇄성이다. 지금까지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던 요인은 근면·성실로 대변되는 자국민의 고유한 문화적 우수성 덕택이었다. 하지만 미국을 추월하고 글로벌 자본시장경제를 제패하면서 자국민의 문화적 우수성은 ‘우리 식대로’로 변질됐고 그 폐쇄성은 더욱 강화됐다.
일본의 강화된 폐쇄성은 자기들만의 표준을 고집하려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낳았다. 특히 반도체는 1990년대부터 수평 분업 구조가 본격화됐지만 일본 기업은 오랫동안 익숙하던 방식인 수직 통합만을 고집했다. 이러한 일본 방식은 세계 각지에서 저렴하게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조립하는 수평 분업 구조를 당해낼 수 없었다.
글로벌 리더가 없다는 것도 일본의 경쟁력 저하 원인 중 하나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MS의 사티아 나델라, 펩시코의 인드라 누이, 어도비시스템즈의 산타누 나라옌은 인도 출신의 미국기업 CEO다. 미국은 ‘멜팅폿’(Melting Pot)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서 건너온 이민자가 세운 나라답게 미국 출신이 아닌 사람이 최대기업들을 리딩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했다.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만나는 사람의 10명 중 8명이 아시아인이다.
폐쇄성은 다양성의 반대 개념이다. 세계는 평평한데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도 의욕이 넘치는 사람, IQ가 높고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모험가를 끌어들이는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일본에게 ‘제2의 소니’는 없다. 일본 사람들은 재능이 넘치고 수준 높은 사회적 인프라, 뛰어난 교육체계, 강한 가족관을 갖추고 있다. 모두가 완벽한 듯 보이지만 전체를 보면 모든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이유 역시 문화적 폐쇄성과 관련이 깊다.
일본 경제의 침몰이 보여주는 교훈은 폐쇄성의 무서움이다. 이 교훈은 경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폐쇄성을 고집하는 순간 배움은 근시안적이고 변화는 수동적이게 돼 결국 서서히 침몰하는 선장을 양성하게 된다.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창조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연관검색어
연관검색어